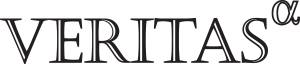황치혁 한뜸한의원 원장
황치혁 한뜸한의원 원장.
매일 환자들의 등을 본다. 등 전체에 뜸을 뜨기 때문이다.
간경변과 암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등 전체에 생강을 깔고, 그 위에서 쑥을 태우는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다. 치료가 끝난 뒤에 등 특히 독맥을 살펴보면 환자의 병세(病勢)를 가늠할 수 있다. 등 전체의 색이 분홍빛으로 고르게 나타나면 오장육부가 고르게 잘 움직이는 상태이다. 건강한 몸이다. 만약에 등의 색이 얼룩덜룩하면 좋지 않다고 본다. 똑같이 쑥의 열이 가해졌는데도 희게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특정 장기의 기능이 저하된 것이다. 반대로 밝은 분홍빛이 아니라 검붉은색을 띠면 그 경혈에 해당하는 장기의 혈액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꼬리뼈부터 머리 정중앙을 지나는 독맥의 경혈이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선 3천 년 전부터 독맥이란 경락의 특정 부위(경혈)를 장기와 연결해 진단과 치료의 부위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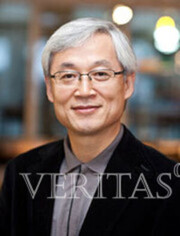
“장풍을 받아라!”
“윽, 나보다 한 갑자 내공이 높은 적을 만나다니…”
아버지들은 학창 시절 교과서 아래 몰래 숨겨둔 무협지를,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의 판타지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주인공이 동굴에서 비급과 영약을 얻어, 임독맥을 타통해 소주천을 이루고, 절세고수가 되는 장면을 읽었다. 그때 임맥과 독맥이란 말을 접했다. 단전, 전중, 백회, 회음 같은 임맥 독맥의 혈자리를 들었다.
놀랍게도 이 용어들은 한의학에서 매일 사용되는 실제 의학 용어다.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침을 놓는 곳이 바로 이 혈자리들이며, 이 점들을 연결한 선이 경락이다. 무협지의 환상적인 세계와 한의학의 임상 현장이 임독맥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 것이다.
한의학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전체 기운을 '기(氣)'라고 한다. 이 기는 대개 팔 다리와 몸통을 흐르는 12개의 경락을 따라 순환한다. 그런데 12경맥 외에도 특별히 중요한 두 경락이 있으니, 바로 몸의 정중선을 흐르는 임맥(任脈)과 독맥(督脈)이다.
기(氣) 수련을 하는 이들은 임맥과 독맥을 나무의 굵은 줄기에 비유한다. 12경락이 가지라면, 임독맥은 생명력의 근간이 되는 줄기인 셈이다. 그만큼 임독맥의 순환이 원활한지가 건강의 핵심이 된다.
임맥은 회음부에서 시작해 인체의 앞쪽 정중선을 따라 올라간다. '맡길 임(任)'자가 붙은 이유는 이경맥이 음맥(陰脈), 즉 음기의 흐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임맥은 복부, 가슴의 중심선을 지나며 관원, 중완, 전중 같은 중요한 혈자리들을 포함한다.
임맥은 특히 소화기와 생식기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의학 고전에서는 ‘임주포태(任主胞胎)’, 즉 임맥이 태아 양육과 생식을 주관한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임맥의 기혈 흐름이 막히면 소화불량, 생리불순, 생식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독맥은 꼬리뼈 부근에서 시작해 척추를 따라 올라가 정수리의 백회를 지나 윗입술까지 이어진다. '독(督)'자는 '감독하다'는 뜻으로, 독맥이 모든 양(陽경)맥의 기혈을 주관하고 제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맥은 척추, 뇌, 머리와 연관이 깊다. 독맥의 흐름이 약해지거나 막히면 허리 통증, 척추질환, 두통, 목 뻐근함과 같은 증상이 생긴다. 양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정신적 증상, 불면증과도 관계가 있다. 흉추 5번과 6번 극돌기 사이의 혈자리는 신도(神道)혈인데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 흉추 3,4번 사이의 신주혈은 폐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독맥의 혈은 각 장기와 연결된다. 이런 해석은 현대의학의 척수신경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의 임독맥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성은 주로 임맥에서 기운이 울체된다. 스트레스가 심한 여성 환자를 진찰하면 가슴 한가운데의 전중혈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음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음기를 조절하는 임맥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남성은 독맥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목덜미, 특히 대추혈 주위가 뻐근하고 답답해진다. 양기가 우세한 남성은 모든 양기를 조절하는 독맥에서 막힘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진단적 차이는 한의학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같은 스트레스 증상이라도 남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독맥의 기혈순환이 좋아지면 오장육부의 경락이 모두 활성화된다. 단순히 한두 부위의 증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개선된다. 무릎 치료를 위해 임독맥에 뜸을 떴더니 70대 중반 환자가 하초(생식기 부위)에 반응이 생겨 좋아했다는 사례도 있다. 오십견 환자가 백회에 뜸 한 번으로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적인 한의학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집에서도 임독맥을 증진할 방법이 있다. 바로 쑥뜸 중의 한 가지인 직접구이다.
먼저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 번 뜸을 떠보는 것이 좋다. 전문가가 정확한 혈자리를 잡아주면 그 자리에 작은 점이나 흉터가 생겨 이후 집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뜸쑥을 쌀알만 하게 작게 만든다. 혈자리에 로션이나 바셀린을 바른 뒤 그 위에 쌀알 크기의 쑥을 붙인 후에 태우면 된다. 피부에 살짝 화상을 입히는 직접구라는 치료법이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본 혈자리는 백회, 전중, 중완, 기해, 관원이다. 소화기가 나쁜 분들은 처음부터 상완과 하완까지 7개 혈자리에 뜸을 떠도 된다. 하나의 혈자리에만 뜸을 뜨지 말고 임독맥 전체의 기혈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맥의 기순환을 먼저 강화하고, 족삼리와 곡지를 추가해 사지의 기혈 흐름까지 터주면 온몸의 12경맥이 함께 활성화된다.
백회에만 뜸을 떠도 스트레스나 흡연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백회는 독맥의 정점이자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완은 위가 있는 부위로 소화불량이나 식체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 관원과 기해는 하복부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어 임맥의 순환을 돕고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심장병이 있는 환자는 전중혈을 피해야 한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오히려 전중혈을 꼭 떠야 한다. 당뇨가 심한 환자는 상처 회복이 잘 안된다. 직접구는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