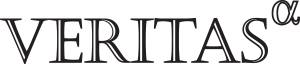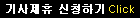정재찬 한양대 입학처장 (국어교육과 교수)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종, <방문객>
교수 연구실을 드나드는 방문객들, 그 중에는 보험 외판원도 있고, 이른바 잡상인도 많았다. 연구도 안 하며 게으르게 있다가도 그들이 들어오려는 낌새만 느껴지면 무슨 대단한 방해라도 받은 듯이 방문객을 향해 지레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다. 저 시(詩)를 읽기 전까지는.
이 봄 입학처장이 돼 다시 읽었다. 그러자 이번엔 모든 학생들이 방문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학생부에 담긴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들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춘기 학창 시절을 보내는 동안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들이 오는 것이다. 그 마음 속 갈피까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슴 속까지 파고드는 저 바람을 닮아야만 한다. 그런 바람의 마음으로 그들의 속살을 속속들이 더듬어 보노라면 웃음과 눈물이 나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러니 우리도 필경 그들을 환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바로 저 시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객관성의 신화를 믿는 이들은 물리적인 수치로 양화된 기록을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95점과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은 95점이다. 맞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점수이지 사람이 아니다. 95점을 받은 두 사람은 정작 천양지차로 다르다. 한눈에 봐도 다르고 아무리 봐도 다르며 들여다볼수록 다르다. 사람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일생, 그 마음의 갈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학 전형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일 따름이다.
공정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입시 제도이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편에서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 누구에게나 공정한 답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마련인 탓이다. 가령, 높이뛰기 1미터 기록을 보유한 신장 2미터의 학생과, 90센티미터를 기록한 신장 1.7미터의 학생 중 과연 누구를 선발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인가. 한 가지 동일한 능력을 비교할 때도 이러하거늘, 원래가 같지 않은 종류의 능력을 재야 할 때는 어찌 해야 할까. 그럼에도 그 차이를 무시하고 그저 한 번에 한 줄로 세워놓고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일이 아니겠는가. 다른 능력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런즉 한 사람에 대해 무려 삼 년의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시선과 분야에서 공들여 기록한 바를 믿어야 하고, 그것을 이번에는 또 여러 사람이 다양한 관점과 척도에서 정성껏 들여다보고 평가한 결과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상호주관성이라면 정량적인 수치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실은 그것이 우리가 진실로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키가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가 아니라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들어가며 이해해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겠다고 하는 바로 그 방식 말이다.
무엇보다 다행하고 희망적이며 중요한 사실은 대학이 입시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부족한 인재도 훌륭한 인재로 키우며, 훌륭한 인재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야 대학다운 대학인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 또한 과거에 얽매인 기준과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에서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한 착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학생부도 나태주 시인의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가 하면 고은 시인의 <그 꽃>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게도 된다. 때때로 그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하는 선택이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내 눈과 마음에 들지 않은 꽃은 나와 취향이 다른 이가 고르리라 믿으면 된다. 긴 호흡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학교와 사회가 모두 예쁜 꽃밭으로 변해 있지는 않을까. 꿈이라고 해도 좋다. 다만 부디 우리들의 어린 꽃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길. 환상이라 해도 좋다. 다만 초임 입학처장의 이 봄 한철 낭만만은 부디 꺾지 마시길. 그래서 오늘도 환대하는 마음으로 꽃다운 학생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