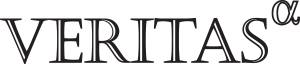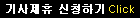베리타스알파 251호 餘滴 - 기자 방담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님의 시 ‘꽃’의 한 구절입니다. 이번 호 교육리더 코너에 소개한 김승유 하나고 전 이사장을 만나고 퍼뜩 떠올린 구절입니다.
김 전 이사장에겐 학생들이 꽃입니다. 가급적 자주 학교를 찾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관계를 맺어가던 김 전 이사장은 그저 아이들이 예뻤고 고마웠답니다. 평생 꿈이었던 멋진 학교,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실험의 신생학교에 들어와준 것만 해도 고마웠고, 아이들의 선한 눈빛에서 힘도 얻는다고요. 재단이사장이 학생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건 물론이고 학생마저도 재단이사장 이름을 모르는 게 보통인 풍토에서, 심지어 교실 안에서도 이름 불릴 시간이 없는 숨가쁜 입시교육 체제에서 김 전 이사장의 ‘이름 불러주는’ 습관은 획기적입니다. 이사장이 이름을 불러주니, 교장도 이름을 불러주고 교사도 이름을 불러주고 행정실장도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고 아이들은 이름 불릴 때마다 늘어나는 하나하나의 관심 속에 자존감을 키우며 한 명 한 명 꽃을 피웠고 꽃이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문화를 만든 사람이 투박한 금융인의 삶을 살아온 김 전 이사장입니다. 금융인으로서의 공과 역시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떠올려보니, 이름 불린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이름보단 직함으로 불린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경입니다. 빛날 경자입니다. 어쩌면 제가 조그맣게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꽃으로 거듭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당장 이름을 외워 부르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겠어요. ‘네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도 놀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