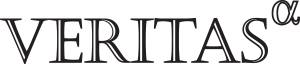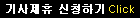-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왜 이렇게 전부 옷을 벗고 있는 거야?” 유럽 여행 중 박물관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번은 해보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낯뜨거워서 외면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유심히 보다가 나중에는 별 관심없이 눈을 돌려버린다. 그런데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그림이 있다. 피렌체의 우피치 박물관에 소장된 보티첼리의 걸작 ‘비너스의 탄생’이다. 그림을 보는 순간, 공간을 압도하는 크기뿐 아니라, 청초한 기품이 흐르는 순백의 피부에 아련해 보이는 여신의 표정 때문인지 마법에 걸린 듯한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처음으로 낳은 것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이다. 모자지간이자 부부가 된 둘 사이에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난다. 그런데 연이어 태어난 괴물 자식들을 우라노스가 탐탁치 않아 하자 가이가는 땅 속 깊숙한 곳에 아이들을 숨겨놓는다. 계속 되는 출산과 땅 속에서 꿈틀대는 아이들로 점점 힘들어진 가이아는 결단을 내리고 낫을 준비한다. 영민한 아들 크로노스가 어머니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 바다에 던졌다. 파도에 휠쓸리던 절단된 신체부위에서 거품이 일어났고, 시간이 지나자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신했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탄생 이야기다.
창백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조개껍질 위에 서 있다. 몸은 길게 늘어뜨려져 부드러운 S자 곡선을 이룬다. 오른손으로는 한쪽 가슴을 감추고, 긴 머리카락으로는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다. 시선은 막연하게 먼 곳을 향한다. 왼쪽에는 큰 날개를 단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바람을 불어주고 있다. 연인 클로리스가 함께 한다. 비너스의 꽃인 장미가 꽃비가 되어 내린다(아프로디테가 로마신화에서는 베누스, 영어로는 비너스).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여신이 무사히 키프로스 해안가에 당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머릿결이 바람에 나부낀다. 오른쪽에는 봄의 여신이 비너스의 벗은 몸을 가려주려는 듯 성급히 붉은 천을 펼치고 있다. 서풍을 온 몸으로 받아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 역시 한껏 뒤로 휘날린다. 하얀 드레스와 붉은 천에도 꽃이 만발했다.
보티첼리는 대담하게 이교(異敎)적인 주제를 택했다. 중세 천 년 동안 그림과 조각은 무지몽매한 중세인들에게 성경을 쉽게 알게 하는 좋은 도구였고, 많은 경우 성스러운 존재를 대신하기도 했다. 벗은 몸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유일했다. 선악을 알기 전의 순결한 존재이거나, 혹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수치스러운 모습, 둘 중 하나였다.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15세기 내내 이탈리아에서 그려지던 주제는 여전히 신약과 구약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티첼리가 비너스를, 그것도 실물 크기의 누드로 그린 것은 기독교적 주제로부터의 이탈과 아름다운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을 미술사에 제시한 중요한 사건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이후 사라졌던 매혹적인 여성의 몸이 복권된 것이다. 이후 지오르지오네, 티치아노뿐만 아니라 숱한 화가들이 앞다투어 여성의 벗은 몸을 화폭에 옮긴다.
주제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는 여전히 중세적인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여신은 고대 그리스의 ‘정숙한 비너스’(Venus Pudica:부끄러워 하며 몸을 가리는 자세의 비너스) 유형에 따라 그려졌지만 고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 목과 허리, 다리, 팔이 길게 늘어져 있고 어깨는 상당히 좁고 둥글다. 이는 14세기에 유럽 전역에 퍼졌던 국제 고딕 양식의 흔적으로, 작은 얼굴에 몸은 길게 하여 우아함을 강조하던 양식이다. 중세 금 세공술에서처럼 정교하게 그린 윤곽선 때문에 형체를 미리 그려서 오려 붙인 것처럼 보인다. 배경도 마찬가지다. 오렌지나무는 좁은 장소에 서너 그루만 빽빽하게 일직선으로 서 있어 자연스럽지 않다. 오른쪽 뒤로 펼쳐진 해안선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안쪽의 나무가 작게 그려진 것에 비하면 공간이 그다지 깊어 보이지 않는다. 당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던 원근법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탓이다. 통일된 공간을 구축하는 것에 보티첼리가 그다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파도 혹은 거품도 움직임보다는 규칙적인 무늬를 연상시킨다. 머리카락 하나하나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던 바람이 나뭇잎이나 파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기이하게 보인다. 그림자가 있긴 하지만 빛의 진원지는 불확실하고 그림은 온통 환하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왜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그림 앞에 섰을 때, 르네상스 이후 화가들이 지향한 ‘현실의 환영’이 아니라, ‘꿈의 공간’, 혹은 ‘태고의 신화’로 초대받은 기분이었던 것 같다. 프랑스의 미술사학자 르네 위그가 말하듯이 그 세계는 “아침 같이 상쾌한, 부드러운 빛의 세계”이고, 이제 시작된 봄의 시간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오랫동안 잊혀진 고대의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꽃으로 막 피어나는 순간이다.
/정연복 편집위원 www.facebook.com/yeonbok.jeong.75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6-1510), ‘비너스의 탄생 The birth of Venus’(1485년경, 캔버스에 템페라, 172.5X278.5cm, 우피치 박물관, 피렌체)